장바구니에 상품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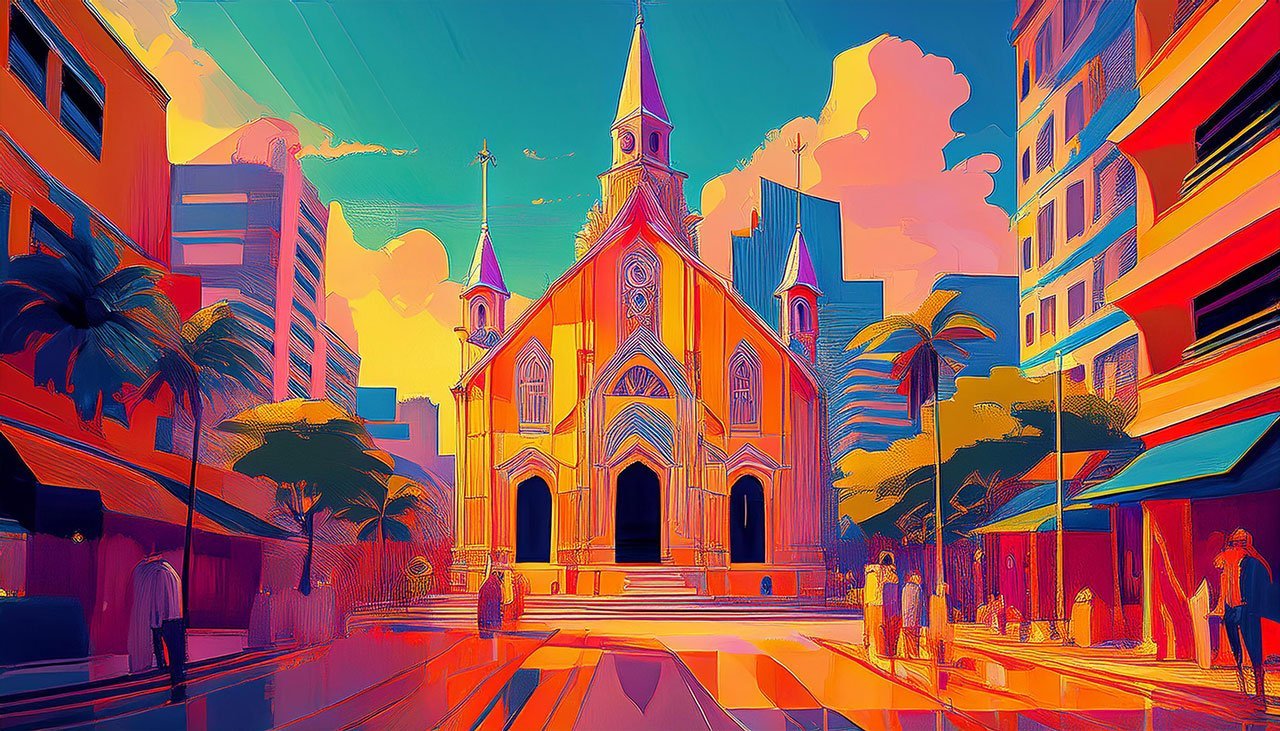
Share
전방개척지의 교회구조와 자급 원리에 대한 소고<strong>1</strong>이 원고는 2013년 10월 포천 광림세미나 하우스에서 개최된 제 6차 AFMI/ASFM 포럼에서 발제 한 원고를 전재한다. 영문으로 제출되었던 원고를 번역하였다. » 김활영 원로선교사
전방개척 선교지는 전통적인 형태의 교회를 개척하기에는 적대적인 환경인 경우가 보통이다. 그런 곳에는 환경에 적합한 교회구조로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외부자인 선교사에게 익숙한 교회구조가 아닌 내부자들에게 적합한 형태를 찾아내야 한다.
목차
들어가는 말
한국어에서는 삼자원리를 소개하면서 용어가 약간 혼동되어 있다. Self-Support란 말을 한국어에서는 “自給” 이라는 문자적인 번역 용어가 있음에도 “自立” 이란 의역을 선호하고 있다. 사실 문자적 의미로 “自立”은 영어의 Self-Standing이다. 아마도 자급이 삼자 중에서 가장 강조되어서 자급하지 못하면 교회가 자립하지 못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필자는 본고에서 자립교회 (self-standing church)를 자급교회 (Self-Supporting church)와 구별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자립교회는 문자 그대로 스스로 서서 걸어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를 지칭한다. 자립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스스로 재생산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교회로서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건강한 주체를 지칭한다. 자급, 자치, 자전이라는 삼자원리와는 상관 없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개체의 믿음 공동체 (개 교회)이든 또는 믿음공동체의 연합체 (교단 혹은 광역 교회)이든 참 교회는 다 자립교회들이다. 이 삼자 원리는 교회의 본질 보다는 겉으로 나타나는 형태에 더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 아닌가 한다. 자급의 지나친 강조는 전방개척선교에 부정적인 요소로 혼돈을 일으킬 가 염려된다. 특별히 전방 개척지에서는 타 종교의 종교형태를 모방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려는 유혹이 되는 용어가 될까 걱정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자급이라는 말과 삼자원리는 교회의 본질 본다는 교회의 형태에서 생긴 용어임으로 전방 개척지에서는 자립교회 설립과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히려고 한다. 그래서 먼저 전방개척지가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삼자원리의 역사적 발전과 적용에 대해여 알아본 후에 어떤 교회가 자립교회 인가를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밝혀보려고 한다.
전방 개척 선교지 (The Frontiers)
랄프 윈터가 전방개척지란 용어를 현대 선교에 소개하면서 선교사들과 전략가들이 다투어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 용어를 성경적이기보다는 너무 서구적이고 식민지 냄새를 풍기는 용어로 비판하는 자들도 있지만<strong>2</strong> 때까지 서구 복음주의 선교사들은 선교지인들을 자기 나라도 없는 natives라고 불렀고, 그 후 탈 식민지시대에는 nationals로 바꾸었으며, 70’년대에 들어오면서 people로 불렀는데 이는 소외된 민중을 의미한다. Unreached People에서 Frontier Mission 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서구인들의 정복적 전략용어로 특히 미국에서는 서부 개척을 위해 써 오던 용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서 ethne 를 지칭하는 이 말을 대체하는 새 용어를 만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이 용어를 인하여 “미완의 과업 완수”니 “10/40 창문지역”, “미전도 종족” 같은 용어와 선교 전략과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윈터는 전방개척지를 정의 하기를 “선교의 전방은, 일반적인 전방처럼 우리가 반듯이 넘어 가야 할 경계선이나 장애물이다. 비록 분명히 알 수 없거나 또는 금지되고 반대 당하는 장애물이기도 하다”<strong>3</strong>한선지포 2006년 주제 강의라고 하였다.
한편, 한국 선교단체 협의회에서는 전방개척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미전도 종족이 있는 곳, 지리적으로 복음에 소외된 곳, 문화적으로 미 복음화된 곳, 교회가 없거나 약한 곳이 전방이란 개념으로 공유”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서, 일반적인 선교지역과 전방개척 지역을 구분 하였고, 지역 마다 다른 전략적 접근을 위하여 개척 지수를 나누었다. 전방개척 선교 지의 지수는 F1, F2, F3로 나누고 F1 은 복음화 율이 5%-10% 정도를 가리키고, F2 는 복음화 율이 5% 미만이나 신자에 대한 핍박이 없는 지역을 말하고, F3는 같은 5% 미만이라도 핍박이 심한 지역을 가리킨다. 전방개척 선교 지에 선교사 파송을 집중하고, 각종 지수에 따라 다른 전략적 접근을 시도할 것을 주문 하였다. <strong>4</strong>http://kwma.org/dev/pop/01.html
결론적으로 전방개척지는 자립하는 교회가 없거나, 있어도 대상에 비하여 그 숫자가 극히 적은 지역이나 족속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원시교회가 개척되고 있는 시대의 선교지도 전방개척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고 성장하여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의 전방 개척지에 교회가 탄생하고 성숙하는 가장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급교회화 삼자원리
선교의 세기인 19세기에 선교사들은 교회 개척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 시대의 선교를 진두 지휘하였던 영국의 Church Missionary Society의 총무 Henry Venn과 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의 총무였던 Rufus Anderson은 선교사들에게 소위 삼자원리(Three-self Formula- 자급, 자치, 자전)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선교사들에게 적용할 것을 강조 하였다. 또, 미국장로교회가 한국에서 교회개척에 크게 성공한 전략에서 소위 네비우스 정책에다 공을 돌리고 있다. 다 아는 대로 네비우스 원리 혹은 정책을 요약하면 삼자원리이다. 이 삼자원리는 당시의 상황에서 매우 훌륭한 전략이었고 오늘날도 바람직한 전략으로 적용할 선교지가 많은 것은 틀림없다. 또한 현대 선교운동에서 삼자원리에 이어 토착화라든가 상황화와 같은 용어가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성육신이나 내부자 운동 같은 용어들까지 소개되어 선교 전략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 선교학자 전호진 이미 20년 전에 “한국 선교: 과거의 유산, 미래의 방향” 이란 저서에서 Venn, Anderson, 그리고 Nevius가 말하는 삼자원리를 자세하게 분석하고, 이 선교정책이 세계 선교, 특히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 그는 Venn, Anderson 그리고, Nevius 모두가 자급을 삼자 중에서 다른 2자 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Venn은 자전이란 용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았고, Anderson은 Venn으로부터 자치란 용어를 배웠다고 했다. Nevius와 함께 이들 세 사람은 자급이야말로 교회가 스스로 서서 발전하는데 근간이 된다고 보고 자급에 기초하여 선교 전략을 세웠다고 소개하고 있다. 동시에 Peter Beyerhaus같은 선교학자는 이들의 삼자원리가 성경에서 나온 이론이라고 하기보다는 실용적 경험에서 나온 선교전략이라고 비판 하였고, Roland Allen 같은 학자도 Nevius 의 이론이 바울의 전략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strong>5</strong>전호진, “한국교회 선교: 과거의 유산, 미래의 방향”, 성광 문화사, 1993. 서울. Pp 96-101그럼에도 불고하고 그는 세분의 의견을 비교하고 해석하면서 내린 결론으로 자급이론은 한국교회의 탄생과 발전을 통하여 얻은 귀중한 서구선교의 유산으로 21세기 선교 현장에서도 자급하는 교회 개척에 주력해야 한다고 한국교회에 도전하고 있다. 특히 한국선교가 당면한 돈 선교란 비판에 대하여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귀중한 유산을 잊어 버리고 있는 듯한 한국선교를 안타까워하고 있다.<strong>6</strong>동계서: pp 187-211 그의 도전은 교회개척을 두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에게 미래 선교의 방향 제시로 받아 드려지고 있다.
Venn을 위시한 Anderson과 Nevius, 그리고 현지 교회의 자립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자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는 대개 일치하고 있다. 삼자가 서로 상관 관계가 있음에도 경제적 자급을 훨씬 더 무겁게 취급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의 본질 문제보다는 지난 세기들의 교회 형태에 기인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신약에서 자립교회
사람은 태어나서 적어도 일년은 걸려야 스스로 일어서서 조금씩 걸을 수 있다. 그러나 양과 소와 같은 덩치가 큰 동물 중에도 태어나는 즉시 스스로 일어설수 있을 뿐 아니라 뛰어 달려갈 수 있는 포유동물들도 적지 않다. 성경에는 교회를 양떼에 비유한 곳도 많다 (마 26:31, 요10:14-16, 26-27, 21:16-17, 행 20:28-9, 벧전 5:2-3). 주님을 목자로 따르는 양 무리를 지칭하는 지상의 지 교회도 사람처럼 긴 기간이 필요하지 않고, 양과 소처럼 탄생과 동시에 스스로 서서 달릴 수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인, 살아있는 조직체인 교회는 탄생과 동시에 스스로 서서 걷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지 교회들도 탄생과 동시에 즉시 스스로 서서 걸었다. 즉 자립교회로 탄생되고 성숙하였다. 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들은 세포분열을 통하여 순식간에 동일한 DNA를 가진 여러 독립된 개체로 번식한다. 그처럼 초대교회는 역동적인 생명체로써 성령의 역사로 폭발적인 번식이 일어난 사건의 연속이었다. 그러므로 원시교회에서 어떻게 스스로 서서 걸어 갈수 있는 자립교회로 탄생하고 요원의 불길처럼 확장되어 왔던가를 살펴보자.
신약교회의 모 교회는 예루살렘교회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정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자립교회로 탄생하였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이 교회는 120명 멤버에서 3000명(2:42), 5000명(4:4)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로 증가하였다는 것(5:14)과 이들이 성전과 가정집과 공회당 등에서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가진 것을 나누며 어디서나 언제든지 복음 전파하였다는 것과 사도의 조력자를 임명하였고, 장로들이 사도들과 같이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이런 기록밖에는 예루살렘교회의 구조와 형태를 짐작할 만한 구체적인 기록은 별로 없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로써 온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와 나아가서 이방의 여러 도시와 지방에 복음을 전파하여 자립교회를 개척하였는데 그 교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성령의 위로로 숫자도 늘었으며, 자립하여 스스로 걸어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9:31, 11:19-30).
사마리아 교회는 빌립을 중심 한 흩어진 자들이 복음 전파와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세워 졌으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세하여 성령 받기를 도왔다 (8:4- ).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 뿐 아니고 헬라 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된 바나바 와 사울 이 가르치고 권면하여 큰 교회가 되었으며, 수명의 선지자와 교사가 교회를 지도하였다 (11:19-30, 13:1). 그 밖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지방에 세워진 교회들은 바울과 바나바 선교 팀과 흩어진 신자들에 의하여 탄생 되었다. 즉 선교사들로 말미 암에 탄생된 수 많은 교회가 1세기 말에는 지중해 연안 일대의 로마제국 전역에 탄생되어 극한 핍박 속에서도 성숙하여 갔다.
이런 초대교회들의 구조와 형태는 어떠하였는지를 자세한 그림을 그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자급에 대한 기록은 찾기 어렵다. 흉년을 만난 예루살렘교회에 안디옥 교회가 힘써 구제 금을 모아 예루살렘교회에 보낸 것은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과 나눔일 뿐 예루살렘교회의 자립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필요한 형제와 나눔은 예수님도 사도들도 교회를 향하여 간곡히 권한 말씀이나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자급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 자전에 대해서도 예루살렘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로써 사도들이 아닌 일반 제자들이 증인이 됨으로 여러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었다. 사도들이 대표적인 선교사 사역을 하였지만 흩어진 자들 역시 선교사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탄생할 때부터 온 교회가 자전하는 교회로 자립 교회들이었다는 증거다. 자치가 지 교회 혹은 지 교회들의 연합 공동체 내부자 중에서 지도자를 세웠을 경우로 본다면 초대교회 개척은 좀 다르다. 왜냐하면 선교사와 사도들은 파송을 받아 교회를 개척한다는 데 같은 직책이나 사도는 계시의 말씀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란 면에서 전혀 다른 권위를 가진 자들이다. 사도는 그리스도가 창설하신 교회를 지상에 세운 자들이다 (엡2:20, 3:5, 벧후 3: 2). 이 사도들의 상당한 권위는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에 있다. 사도들이 탄생한 자립 교회들을 감독하고, 가르치고 돌보았던 원리와 방법들은 계시의 말씀의 권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선교사들은 자기 받은 바 복음을 계시의 말씀의 권위에 의존하여 전파하고 가르치고 목양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사도시대 교회의 자치는 선교사들이 개척하는 오늘날의 교회와 다를 것이다.
결론적으로, 삼자원리는 초대교회 설립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선교원리다. 자급이란 말은 자립이란 말과 관계가 없어 보인다. 오늘의 선교현장에서 자급은 자체적으로 교회사역을 후원할 수 있는 재원이 자체 교회에서 나온다는 의미다. 그런데 교회의 구조상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비가 필요한 재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치는 선교사와 같은 외부자가 아닌 내부자 중에서 유급지도자를 스스로 세우는 것인데 자급과 직접관계가 있다. 또 자전은 교회의 본질상 당연히 처음부터 자전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인적자원과 결부시킬 때에 역시 재정과 관련된다. 곧 교회의 구조와 형태에 따라 삼자원리는 상당한 의미가 있기도 하고 전혀 상관 없기도 하다.
자립교회와 그 구조
선교학자 성남용은 제7회 ATEA 모임에서 “Rethinking of the traditional ecclesiology in mission fields” 란 발제에서 선교 지에 세우는 교회 (Planting)는 전통적인 크리스탠돔 식의 교회론을 버리고 구조를 혁신할 것을 역설하였다. 그는 새로운 교회론을 근거한 새로운 유형의 교회들을 소개하면서 “교회 없는 기독교” (Herbert E. Hoper), 사이버교회, C5 (Travis)등은 랄프 윈터와는 달리 크리스탠돔의 대안으로는 교회론 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판 하였다. 그럼에도 셀 교회, 가정교회, 교회개척배가 운동의 교회 등의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물론 자신의 성경적인 교회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형의 교회들이 수정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사가 다양한 것처럼 교회도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며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을 지지하는 결론을 내렸다.<strong>7</strong>성남용: “선교 지에서 전통적 교회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가?”아시아 신학교육 저널 제 2호, ATEA, 서울, 1910. Pp49-73
교회는 자립하는 교회로 태어난다. 자립교회는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번식해가기 마련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구현하는데 시대마다 다른 구조와 형태가 다양함을 인정한다면 전방 개척지에는 다양한 구조와 형태를 가진 자립교회를 개척해야 할 것이다.
나가는 말
자급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건강성을 위하여 좋은 것이다. 그러나 선교 현장을 무시한 자급의 강조는 또 다른 비 성경적인 부작용으로 발전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아 왔다. 전방개척 선교지는 전통적인 형태의 교회를 개척하기에는 적대적인 환경인 경우가 보통이다. 그런 곳에는 환경에 적합한 교회구조로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외부자인 선교사에게 익숙한 교회구조가 아닌 내부자들에게 적합한 형태를 찾아내야 한다. 삼자원리를 갖춘 구조가 아니라 자립교회로서 자기 문화와 맞는 옷이 필요하다. 이 옷은 외부자인 선교사의 지도가 아닌, 선지자(구약)와 사도들의(신약) 지도를 좆아 선교 현장의 내부자들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 현장에 적합한 옷을 만드는 작업이 소위 말하는 사자, 즉 자신학화(Self-Theologizing) 이다.
각주
- 1이 원고는 2013년 10월 포천 광림세미나 하우스에서 개최된 제 6차 AFMI/ASFM 포럼에서 발제 한 원고를 전재한다. 영문으로 제출되었던 원고를 번역하였다.
- 2때까지 서구 복음주의 선교사들은 선교지인들을 자기 나라도 없는 natives라고 불렀고, 그 후 탈 식민지시대에는 nationals로 바꾸었으며, 70’년대에 들어오면서 people로 불렀는데 이는 소외된 민중을 의미한다. Unreached People에서 Frontier Mission 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서구인들의 정복적 전략용어로 특히 미국에서는 서부 개척을 위해 써 오던 용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서 ethne 를 지칭하는 이 말을 대체하는 새 용어를 만들지 않았다.
- 3한선지포 2006년 주제 강의
- 4http://kwma.org/dev/pop/01.html
- 5전호진, “한국교회 선교: 과거의 유산, 미래의 방향”, 성광 문화사, 1993. 서울. Pp 96-101
- 6동계서: pp 187-211
- 7성남용: “선교 지에서 전통적 교회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가?”아시아 신학교육 저널 제 2호, ATEA, 서울, 1910. Pp49-73
Written by
김활영 원로선교사(장양백사모)
- 1942년 12월 25일생, 장양백 사모와 1남2녀, 대구동신교회 1977년 필리핀 파송 선교사, GMS 초대사무총장, GMS 필리핀선교사, 필리핀 장로회신학교 초대학장, 필리핀 선교사자녀학교 초대교장 등 주요저서로는 그의 나라 그의 순례자/ 2018 가 있습니다.
Related Articles
오피니언 김활영 원로선교사(장양백사모)2024-05-29
김활영 원로선교사(장양백사모)2024-05-29
총회(GMS) 선교 100년사와 미래적 전망
총회(GMS) 선교 100년사와 미래적 전망 » 기고: 김활영 원로선교사 (장양백 사모) »...
오피니언 김활영 원로선교사(장양백사모)2024-05-24
김활영 원로선교사(장양백사모)2024-05-24
한국장로교회 해외선교와 GMS 역사 (1907- )
한국장로교회 해외선교와 GMS 역사 (1907- ) » 고 김활영 원로선교사 I. 들어가는...
오피니언 김활영 원로선교사(장양백사모)2024-05-24
김활영 원로선교사(장양백사모)2024-05-24
세계 선교 동향과 총회(GMS) 선교 전략
세계 선교 동향과 총회(GMS) 선교 전략 » 글 김활영 원로선교사 선교 신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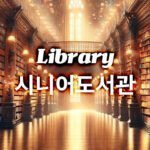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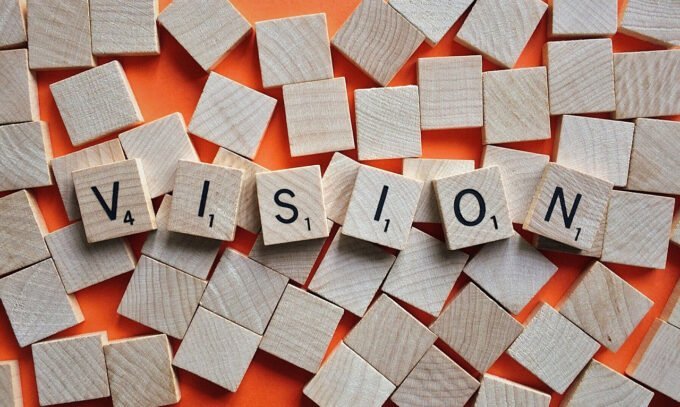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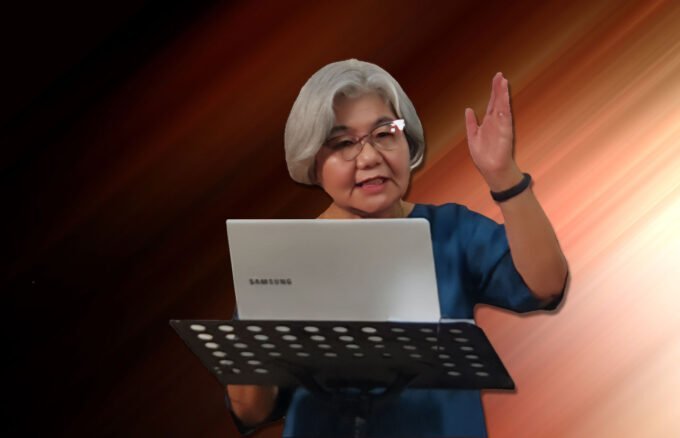


Leave a comment